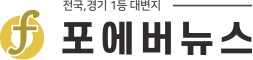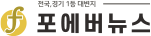그리운 내 님이여
시인/영화감독 우호태
돈키: “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젓는 뱃사공… 내님을 싣고 떠나던 그 배는 어데로 갔소, 그리운 내님이여.”
1938년 김정구 선생이 부른 눈물젖은 두만강이야. 여섯 마디 넘으면 귀에 익은 노래지.
호새: 독립운동 나가느라 두만강 건너간 님을 그리는 노래네요.
돈키: 사람 살아가며 가장 힘든 게 뭘 것 같아?
호새: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들죠.
돈키: 그리움도 그 가운데 하나지. 내 힘으로 해소가 안 되잖아. 고향이든 연인이든, 갈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무슨 문제겠어. 상사병은 약도 없지. 님을 보내놓고 그리움이 얼마나 컸겠어. 이승에서 못 풀면 영혼도 떠돌걸.
호새: 그 그리움이 삶의 버팀대 아닌가요?
돈키: 그건 겪어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.
호새: 백두산에 내린 빗방울 한 방울은 압록강으로, 다른 한 방울은 두만강으로 흐르니 결국 남해에서 만나겠죠?
돈키: 한 어미가 낳았으니 가능할 수 있지.
호새: “엄마 찾아 삼만리” 마르코 형제처럼 물방울 형제인가요? 시점을 고조선 시대로 해볼까요? 상봉 시점은 언제로 할까요?
돈키: 감상에만 젖어서는 안 돼. 세상 녹록치 않아. 훼방꾼이 많으니 길조심부터 해야지.
호새: 하구에 녹둔도, 이제 잃어버린 땅이라던데요…
돈키: 인기리에 방영된 불멸의 이순신에서 나온 곳이지. 이순신 장군이 그곳 둔전관으로 있었어. 여진족과 큰 싸움이 있었던 곳이지. 그런데 1860년, 아편전쟁 뒤 청과 영·러·프 3국 간 북경조약으로 러시아에 넘어갔어.
1430년 세종대왕이 6진 설치하고 김종서 장군 주도로 개척한 조선 땅이었는데…
그 뒤로 가랑비에 옷 젖듯, 1905년 외교권 피탈, 1909년 간도협약, 1910년 한일강제합방까지… 나라가 송두리째 넘어갔지.
호새: 그럼 언제 되찾은 거예요?
돈키: 1945년. 우리 힘이 아니라 연합국에 의해 되찾았지. 시대 변화에 둔한 우물 안 타짜들이 나라를 망친 거야. 그래도 반쪽 땅에서 반세기 만에 경제 10대국에 오른 건 한강의 기적이지.
압록강 맑은 물도 흐르고, 두만강 푸른 물도 설움 이겨내며 지구촌으로 나갔어. 앞으로 반세기에도 큰 변화 맞을 거다.
호새: 그럼 동관진 구석기 유적지로 가보자고요. 사연 있는 곳이라던데요?
돈키: 일본이 만주 공략하려고 철도 부설하다 일본 학자들이 발굴한 곳이야. 자기들 역사에 유리하게 하려고 양심을 저버린 사례지.
그 뒤 스미소니언 조창수 학예관, 고려대 김정학 교수, 충북대 이융조 교수 같은 분들 노력으로 한반도에 구석기 실존이 고증된 최초의 유적지가 됐어.
한반도 인류 역사가 일본보다 앞선다는 큰 이야기지.
돈키: 지난 20세기, 한반도는 지옥과 천당 오갔다고 할까? 1950년대 이후는 이전에 흐트러진 얼룩을 지우는 지지고 볶는 시기였고.
반세기 만에 차오른 이 꿋꿋한 에너지가 21세기 후반에 또 한 번 용트림해야 할 텐데…
호새: 종이배 띄울까요, 종이학 날릴까요? 동해에서 만나겠죠.
그 옛적 두만강 넘나들며 나라 품었던 분들도 뵙게요.
돈키: 백성들이 일군 땅을 타짜들이 지키지 못했으니 발걸음이 무거웠을 거야.
호새: 지난 추석특집 대한민국 어게인에서 가수가 그러더군요.
“백성이 깨어 있어야 나라를 지킨다.”
이러다간 코리아 땅덩이 누가 떼어가겠어요.
돈키: 심장이 튼튼해야 질주도 하는 법이지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