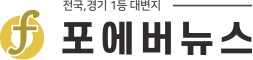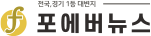신고산이 우루루루
시인/영화감독 우호태
돈키:
“신고산이 우루루루, 함흥차 가는 소리 들리면
구공산 큰애기 또다시 보퉁이 싼다지.
삼수갑산 머루·다래야 엉키고 설켜 있는데…
나는 언제 님을 만나 얼크러설크러질까—”
이 맛이 신고산타령이지.
호새:
신고산 가락까지 나오니… 나진·선봉 경제특구는 그냥 지나치겠네요?
돈키:
서너 곳만 훑고 남하하자며? 북청군 한번 들렀다가 어여 월남하자구.
호새:
혹시 물장수 하려구요?
돈키:
하하, 북청물장수는 옛 소리야. 하지만 함경도엔 우리 귀에 익은 얘깃거리가 그득하지.
호새:
파인 김동환 시인의 새벽을 깨우던 그 북청물장수 발걸음도 이제는 전설이겠죠.
돈키:
파인 시인이 함경도 출신이라 그 감각이 남달랐어.
고향 사람들이 삼청동 약수를 길어다 파는 모습,
마치 신사업을 시(詩)로 그린 셈이야.
호새:
이북분들 재테크가 타고났나 봐요. 강물도 팔고, 약수도 팔고.
요즘엔 ‘백두산’ 생수도 나오던데요?
돈키:
그래, 수완 하나는 으뜸이지. 수방도가로 번창했다던데—
생수 회사의 원조라 해도 틀린 말 아니야. 앞서갔어, 시대를.
호새:
그런데 북청 하면 사자놀이 유명하잖아요?
한반도에도 사자가 살았던 건가요?
돈키:
아랍을 지나 중국을 거쳐 들어온 신앙·주술 문화가
‘벽사진경(辟邪進慶)’을 바라는 우리가락 속에 스며든 거지.
고려시대 ‘사자 향로 뚜껑’도 남아 있으니,
비록 화석은 없어도—사자, 살았을지도 모를 일 아니겠어?
게다가 풍산개 용맹은 남도의 진도견에 견줄 정도라잖아.
호새:
세월이 이만큼 흘렀으니… ‘함흥차사’ 설화는 어떤 게 맞나요?
돈키:
어느쪽을 들춰볼까나.
권력의 속성이 드러나는 형제의 비극을 말할까,
목숨 걸고 왕명을 수행한 박순을 조명할까,
아니면 태조 이성계의 회한을 곱씹을까…
그러나 결국은, 한여름 함흥냉면처럼
우리 생활 말 속에 가장 차갑고 또 가장 익숙하게 자리 잡았지.
마치 평안감사, 영변약산처럼 말이야.
호새:
그럼 ‘원산폭격’은요? 학생 때 얼차려 이름으로 듣기만 했지.
돈키:
맞아. 전쟁시 폭격에서 따왔다는데…
학창 시절엔 뒷짐지고 머리를 땅에 박고 버티느라
정신이 얼얼했어.
지금은 가혹행위라 사라졌다지만,
그 뜨거운 시절 버팀목이 오히려 그때 그런 경험이었을거야.
“머리 박아, ××들아!”
“명사십리 해당화가 그냥 피는 줄 알아”—고 하시던 교관 목소리,
아직 귀에 쟁쟁해.
호새:
그런 의미에서 보면, 흥남부두 피난민들이 맞은 눈보라의 아픔과도 비견되겠어요.
돈키:
1950년 12월, 한겨울 흥남부두의 절규는
지금도 얼음장처럼 실향민 가슴에 박혀 있지.
군함에 실린 무기까지 버려가며
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 했던 그 시간들.
그곳에서 스러진 국군과 유엔군의 넋들….
“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흥남부두에—”
현인 선생이 부른 굳세어라 금순아가
그 절망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게 했던 거야.
호새:
부산에 내려가면, 그 노래에 나오는 영도다리·국제시장도 들러야겠네요.
돈키:
그러자고.
옛 흑백 필름 속에서 군함 가득 선 사람들 보였지.
그걸 ‘크리스마스의 기적’이라 부르잖아.
불과 70년 전 일이야.
고조선이니 고구려니 하는 오래된 역사를 논하지 않아도—
식민지, 그리고 6·25의 참상은
‘내 나라’가 얼마나 소중한지
뼛속 깊이 가르쳐준 경험이지.
그때의 난민들, 보트가 아니라 군함 피플이었던 셈이야.
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고
호새:
기분이 꿀꿀한데… 신고산타령이라도 같이 불러볼까요?
돈키:
얼크러설크러지게, 한번 질러볼꺼나.
돈키·호새 (합창):
“신고산이 우루루루, 함흥차 가는 소리에
구공산 큰애기 반복 짐만 싼다네—
삼수갑산 머루·다래 엉크러설크러졌는데
나는 언제 님을 만나 얼크러설크러지느냐—”
호새:
그간 바람이 하늘에 닿지 않았나 봐요.
우리도 ‘함흥차사’인가 봐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