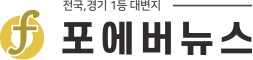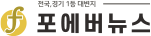흰사슴 놀이터
시인/영화감독 우호태
호새: 삼총사가 함께 오르나요?
돈키: 제주 일정은 한반도 유람의 맺음지지. “One for all, All for one!”
13, 4년을 함께 달려온 마라톤 동료들이야. 이번 유람도 마라톤 같은 여정, 그 피니시 라인이 바로 백록담이거든. – 휘릭
호새: 하늘에서 내려다봐도, 땅에서 올려다봐도 안기고 싶은 산이라면요.
돈키: 어머니 품 같지 않겠니? 옛적에는 영주산이라 불리며 설화가 끝없이 전해졌고, 누구나 찾는 영산이라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해.
뜀맨1: 여러 번 올라왔지만 오를 때마다 식물군의 변화가 참 묘해. 난대식물에서 초원, 활엽수림, 침엽수림, 관목림, 그리고 고산식물 띠까지. 그 모습이 우리네 삶 같아.
어머니 품에서 옹알이하던 아기가 아장거리다 풀밭 뛰놀고, 세상이 다 내 것 같던 청년은 어느새 둥그런 중년의 얼굴을 닮아가고, 마침내는 비워가는 노년의 경지에 닿는 것처럼.
뜀맨2: 솟구치던 청년의 기상이, 노년에 와서는 정으로 굳어 못이 되는구먼. 이곳은 이승과 천계의 경계라 했고, 흰사슴이 물을 마시던 곳, 은하수가 담긴 곳이라했지. 신선이 노닐던 산.
우리 삼총사도 삼신산에 오르는 셈 아니겠어?
소동파가 적벽에서 흥취에 날개 돋아 신선이 되었다(羽化而登仙) 했듯, 우리도 이 산의 향기에 취해 가벼운 날갯짓이 돋는구먼.
돈키: 사람이 향기와 품격을 논하는데, 큰바다 위에 홀로 솟은 이 산이야 오죽 고매하랴.
호새: 그 고매한 품에 이끌려 진시황의 서복도 불로초를 찾아 이곳에 들렀겠지요?
돈키: 불로초라… 선계에 등장하는 장수의 풀이지. 동자·동녀가 시중 드는 신선의 풍경.
불로초를 그려봐라. 고사리, 버섯, 전복, 해초…
호새: 거기에 자리돔, 옥돔, 흑돼지, 감귤과 한라봉을 얹으면 되겠네요. 요즘도 중국인들이 불로초 구하듯 제주를 찾는가 봐요?
뜀맨2: 마음속에 그리는 이상, 그게 곧 불로초지.
뜀맨1: 서복 배가 일본까지 갔다 하니, 탐라국은 이미 중국·일본을 잇는 해상 벨트였던 셈이야.
돈키: 맞아, 고대 탐라는 동아시아의 개방된 해상 거점이었지. 유구, 안남, 일본, 중국을 잇는 교역의 땅.
21세기의 불로초는 뭘까? 생명공학일까, 아니면 제주 특산물의 새로운 가치일까.
호새: 물목 실어 나르며 쉬어가고, 경관 좋아 들렀다 가고, 태풍탓에 표착하기도 하고… 그야말로 징검다리 섬나라인 셈이네요.
돈키: 한라산이 말없이 내려다보며 탐라왕국의 애환과 기쁨을 다 지켜봤겠지.
불로초 바이어의 내왕, 신라와의 다툼, 고려 편입, 삼별초의 최후 항전, 한 세기를 끈 몽골의 지배, 공물 진상에 시달린 농어민들, 근세의 식민지 시대, 그리고 해방 뒤 4·3의 비극까지….
뜀맨1: 하늘도 애달아 눈물 흘렸는지, 그 눈물이 녹아 봄바람에 유채꽃, 왕벚꽃으로 피어나 육지에 봄소식을 전하나 봐요.
뜀맨2: 감귤이 방울방울, 한라봉이 벙울벙울 익어가니 “혼자 옵서예”보다 “둘이 옵서예”가 훨씬 낫겠지.
호새: 눈으로 보고, 귀로 듣고, ‘뛰뛰빵빵’ 드라이브도 했겠다,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3번 ‘열정’까지 들었으니… 이제 진짜 제주 맛보러 가야죠.
뜀맨1: 물질로 살림 꾸리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시설을 세워온 해녀들 이야기, 해녀박물관에서 봤지?
그들의 희생이 한라산의 기상만큼 제주라는 섬의 품새를 지탱하는 굳은 주춧돌이야.
뜀맨2: 정상에 서니 기쁨이 차올라 백록담에도 잔잔한 파문이 이는 듯하더만.
돈키: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 가슴이 데워지는 그 마음,
“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”는 어느 철인의 마음에는 못 미칠까 싶구먼.
호새: 지구촌 집단지능 플랫폼에 푸른 물결 백록담을 주제로 시(時題)라도 올려볼까요?
돈키: 하하, 그러다 지구촌에 불로수 ‘백록수’가 뜨겠네.
삼다수는 어쩌고?